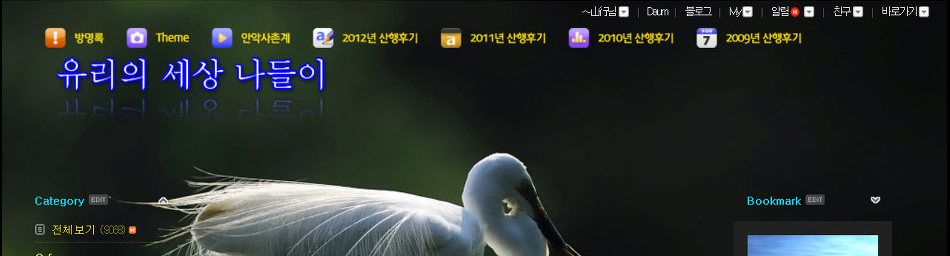고전의 보고(寶庫) ‘삼국지의 고사성어’
최용현(수필가)
‘만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두의 유래가 삼국지의 고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자로는 만두 만(饅)자와 머리 두(頭)자를 쓰는데 ‘머리 두’ 자를 쓰는 이유를 아는가.
지금의 미얀마 북부지역인 남만지방에 노수(爐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수세(水勢)가 험하여 자주 재앙을 일으켰으므로 이 지역 사람들은 강물이 거칠어져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면 산 사람 머리를 물에 던져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고 개선할 때 이 강가에 이르러서 격랑을 만나자, 밀가루 반죽 속에 쇠고기를 넣어서 사람 얼굴의 형상을 만들어 제물로 바치니 노수의 격랑이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를 이름 지어 만두(饅頭)라고 하였고 이것이 후세에 까지 전해져 오늘날의 만두가 된 것이다. 만두 표피의 주름이 사람얼굴의 형상이었던 셈이다.
고사성어란 문자 그대로 고사(故事)에 의해 형성된 말인데, 여기서 고사란 거의 대부분 고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 온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사성어가 많이 있을 법한데, 필자의 식견이 짧은 탓인지 함흥차사(咸興差使) 외에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국산 고사성어를 찾지 못했다.
욕심 같아서는 암행어사나 평양감사 같은 말도 고사성어의 범주에 넣을 만한데, 그러자니 삼수갑산이나 송도삼절 따위도 넣어야 할 판이다. 이들은 성어(成語)로는 족하나 뚜렷한 고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나오는 중국산 고사성어는 그것만으로도 책 한권 분량이고,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만 추려보아도 상당한 숫자이다. 한자의 무궁무진한 조어력(造語力)에 그저 입이 떡 벌어질 뿐이다.
삼국지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 몇 가지를 골라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계륵(鷄肋)은 닭갈비, 먹으려니 먹을 게 없고 버리려니 아까울 때 쓰는 말이다. 한중에서 유비와 대치하던 조조가 군호를 물으러온 하후돈에게 했던 말이다.
백미(白眉)는 눈썹이 희다는 뜻으로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인물을 천거할 때 ‘마(馬)씨 5형제(馬氏五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백미, 즉 눈썹이 흰 마량(馬良)이다.’하여 생겨난 말이다. 읍참마속에 나오는 마속(馬謖)은 마량의 실제(實弟)이다.
보통 고사성어라 하면 네 글자로 된 숙어를 연상하게 되는데,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은 것을 도원결의(桃園決義),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간 것이 삼고초려(三顧草廬), 제갈량이 남만왕 맹획을 일곱 번 잡아서 일곱 번 놓아준 것이 칠종칠금(七縱七擒)이다.
엎드리고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를 뜻하는 와룡봉추(臥龍鳳雛)는 각각 제갈량과 방통을 의미하는 말이고, 농(籠)을 쳐서 합병하고 다시 촉(蜀)을 바라본다는 뜻의 득농망촉(得籠望蜀)은 그전에 한(漢)의 광무제가 썼던 말을 조조가 리바이벌한 말이다.
또 범강장달(范疆張達)은 덩치가 크고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장비를 살해한 두 무뢰한의 이름이다. 장비가 범강과 장달에게 무리한 군령을 내렸다가 항의하는 이들을 나무에 매달아 실컷 두들겨 패고 술에 곯아떨어져 잠든 사이 이들이 장비의 목을 벤다.
이외에도 고육지계(苦肉之計), 수어지교(水魚之交), 괄목상대(刮目相對), 목우유마(木牛流馬), 비육지탄(脾肉之嘆), 망매해갈(望梅解渴) 등 많으나 이쯤 해두기로 한다.
드물지만 세 글자로 된 고사성어에는 출사표와 낙봉파, 그리고 칠보시가 있다.
출사표(出師表)는 출병할 때 임금께 올리는 글인 바, 제갈량의 출사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낙봉파(落鳳坡)는 공명에 버금가는 귀재인 봉추 방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곳이다.
칠보시(七步詩)는 보위를 물려받은 조조의 장남 조비가, 조조가 생전에 총애하던 시문에 뛰어난 동생 조식을 불러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에 형제를 주제로 시 한수를 지어라. 그렇지 못하면 여덟 걸음 째에 네 목이 방바닥에 떨어지리라.’ 하며 숙제를 내렸다. 이때 문재(文才)를 타고난 조식이 일곱 걸음 만에 지은 시이다.
煮豆燃豆萁 콩을 볶으려 콩깍지로 불을 지폈네
豆在釜中泣 콩은 가마솥 안에서 뜨거워 우네
本是同根生 본래 한 뿌리에서 나온 몸이건만
相煎何太急 왜 이다지 급하게 볶아대는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은 울면서 마속의 목을 친다는 뜻으로, 아끼는 부하를 제거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그때의 정황을 살펴보자. 제갈량의 북벌군이 한중을 석권하고 기산에 진출하자, 위에서는 명장 사마의를 급파하여 제갈량과 맞서게 했다.
제갈량은 군량 수송의 요충지인 가정을 수비하는 장수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다. 만약 가정을 잃으면 촉의 중원진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때 마속이 그 중책을 자원하고 나섰다.
그는 평소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였으나 노회한 사마의와 대결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그래서 제갈량이 주저하자 마속은 거듭 간청했다. 결국 잘못 되면 참형에 처해도 좋다는 군령장까지 썼다.
서둘러 가정에 도착한 마속, 제갈량의 지시는 그 산기슭의 협로를 사수하라는 것이었으나 마속은 욕심을 내어 적을 유인하여 역공할 생각으로 산 위에다 진을 쳤다. 그러나 마속의 생각과 달리 위군은 산기슭을 포위한 채 산 위로 공격해 올라오지 않았다.
식수가 끊겼다. 다급해진 마속은 전 병력을 동원, 포위망을 돌파하려 했으나 용장 장합에게 무참히 참패하고 말았다. 마속의 실패로 전군을 한중으로 후퇴시킨 제갈량은 군율을 어긴 마속을 참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속이 형장으로 끌려가자, 제갈량은 소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고 한다. 제갈량의 결벽에 가깝도록 엄격한 군율과 사정(私情)에의 번민을 헤아려 볼 수 있다.*
'Study > Three Kingdoms Of Chi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조에 대한 평가 (0) | 2010.03.25 |
|---|---|
| 기이한 이야기들 ‘삼국지의 불가사의’ (0) | 2010.02.20 |
| <P>전국옥새는 진시황제 이래로 황제를 상징하는 물건, 황권을 상징하는 물 (0) | 2010.02.16 |
| [스크랩] 삼국지 (1-84편) (0) | 2010.01.13 |
| 36계 줄행랑이라고 (0) | 200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