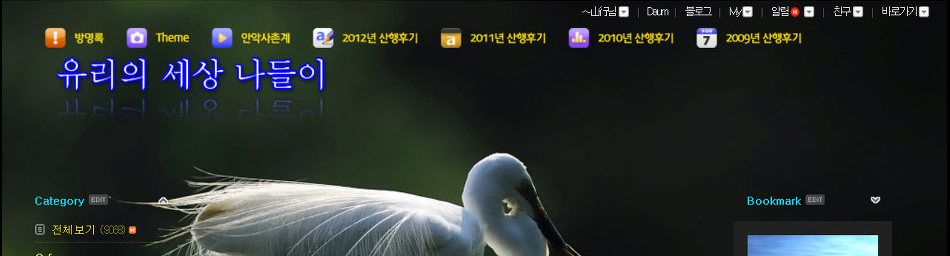|
조조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삼국연의(三國演義)≫를 통해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조조를 과연 어떤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할 때 그를 "조조 같다"고 한다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에는 교활하면서도 잔인하다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촉한(蜀漢) 정통론에 입각해서 유비(劉備)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삼국연의≫는 그와 상대역인 조조에게 너무도 강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삼국연의≫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므로 그 자체가 바로 역사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설속의 조조와 역사속의 조조는 엄연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조조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으나, 송대(宋代) 이래로 간웅으로 폄하되기 시작하여 ≪삼국연의(三國演義)≫가 세상에 나온 이후부터 더욱 부정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노신(魯迅)은 조조를 "재능이 뛰어난 영웅"으로 평가하였으며, 모택동(毛澤東)도 그를 위대한 인물로 칭송했다. 1959년 곽말약(郭沫若)이 조조의 명예회복을 선언하고 나온 이후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를 간신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곽말약의 뒤를 이어 조조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지만, 단지 그를 "난세의 효웅(梟雄)"이라 일컬었을 뿐이다. 효웅과 영웅은 그 의미가 다르다. 효웅은 강직하면서도 야심이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웅에 비해 다소 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조조가 다소 잔인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가 중국역사상 이룩한 공적에 대해서도 묵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조조라는 역사속의 인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봄으로써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호방한 기개의 소유자 조조의 가장 큰 특징은 호방한 기개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의 시문을 읽어보면 그의 영웅적인 기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는 시문에서 자유자재로 전고를 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하였지만 호방하면서도 저속하지 않다. 그의 <관창해(觀滄海)>와 <단가행(短歌行)>에서는 짧은 인생 속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노래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웅적인 기개라 할 수 있다. 그는 생명의 유한성을 영원성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과 우주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였다. 조조는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고 큰일을 처리하는 대범한 인물이었다. 결코 고리타분하거나 인정이 통하지 않는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을 처리할 때는 엄숙하면서도 진지했고, 평상시에는 소탈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사소한 일에는 대충대충 넘어갔다. 지도자의 위엄을 가졌으면서도 인간미와 유우머가 있었다. 관도(官渡) 전투에서 원소를 물리친 후 그의 부하가 원소와 내통한 편지가 발각되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조사하여 죽여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조조는 "당시에 원소의 세력이 강대하여 나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어떠했겠는가!"라고 한 다음, 그 편지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조조가 오환을 정벌하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으나 결국 조조는 반대를 무릅쓰고 정벌을 감행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조조는 당시에 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물색하였고, 그들은 영문을 몰라 모두 두려워했다. 그러나 조조는 결국 그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충고로 만전의 계책을 세운 탓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니 더 이상 그들을 탓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수용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자세는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 엄격한 정치가 그는 20세에 낙양북부위에 임명되었을 때 낙양의 권문세족들과 대립하였다. 부임하는 첫날에 그는 10개의 몽둥이를 관청의 대문밖에 걸어두고, "법을 어긴 자는 문벌귀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때려 죽이겠다."고 선포하였다. 한번은 황제가 총애하는 환관 건석(蹇碩)의 숙부가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하였다가 조조에게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여 이후 아무도 감히 법을 위반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조가 30세에 제남국상(濟南國相)에 임명되었을 때, 제남에 소속된 10여개 현의 관리들이 대부분 문벌세력에 빌붙어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즉시 8개 현령의 직위를 박탈하였다. 그후 다시 그는 미신을 타파하고 그 지역의 문벌들이 세운 800여년이나 된 사당을 모두 없애 버렸다. 그러자 그 지역의 문벌들은 깜짝 놀라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동탁의 난이 일어난 후에는 할거세력을 평정하고 통일을 실현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였다. 조조는 반란의 기치를 든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헌제(獻帝)를 옹호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문벌세력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갔다. 또 북으로 오환(烏桓)을 정벌하여 북방의 변경을 안정시키고, 계속하여 남방 정벌을 감행하여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가 관할한 지역에서는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둔전제(屯田制), 겸병 규제, 조세 경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치둔전령(置屯田令)>, <억겸병령(抑兼幷令)>, <견하북조부령(蠲河北租賦令)> 등을 반포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은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생산력은 급속히 회복되어 사회는 점점 안정되었다. 그는 또 개혁가였다. 그는 몸소 법도를 준수하면서 강경한 수단으로 사회적 폐단을 뿌리뽑았다. 당시에 통치계급들은 사치가 극심하였으며, 특히 장례시에는 화려한 묘실과 각종 금은보화를 부장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기풍의 혼탁을 조성했다. 건안 10년 조조는 호화 장례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 그 이후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 호화 장례가 없어졌다. 건안 11년 조조는 병주(幷州: 지금의 산서성)를 점령한 이후 태원(太原) 등지에 개자추(介子推)를 기념하기 위하여 동지 이후 105일간 불을 때지 않고 찬밥(寒食)을 먹는 풍습이 성행하자, 그것이 백성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명벌령(明罰令)>을 내려 그것을 금지시켰다. 사회질서를 정돈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기 위하여 <수학령(修學令)>을 반포하여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인의(仁義)를 제창하였다. 또 <정제풍속령(整齊風俗令)>을 반포하여 문벌세력 통치하에서 형성된 부당 이익 쟁취, 여론 조작, 시비 전도, 무고자 모함 등의 폐단을 일소하였다. 조조가 시행한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의 시대적 조류와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역사의 전도를 밝게 하였다.
☞ 인재등용 중시 조조는 인재등용을 중시하였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재능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였으며 상벌을 분명히 하고 언로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구현서(求賢書)>, <거현물구품행령(擧賢勿拘品行令)>, <뇌유사취사물폐편단령(賴有司取士勿廢偏短令)>, <구언령(求言令)>, <봉공신령(封功臣令)>, <분조여제장연속령(分租與諸將掾屬令)> 등을 반포하여, 그의 신변에 많은 인재를 불러들였다. 심지어 적진에 있던 많은 명장과 명신들도 그들의 주인을 버리고 조조에게 투항함으로써, 조조의 진영에는 명장과 명신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는 <단가행(短歌行)>에서 이렇게 묘사하였다. 山不厭高, 산은 높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海不厭深, 바다는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周公吐哺, 주공은 언제든지 현인을 예우했기에, 天下歸心, 천하의 인심이 그에게로 돌아갔네.
이 시에서 조조는 세상의 뛰어난 인재들을 모두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마음껏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그의 유능한 장수 장료(張遼)는 원래 여포(呂布)의 사람이었고, 장합(張颌)은 원래 원소(袁紹)의 사람이었다.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진림(陳琳)도 원래 원소의 문인으로 일찍이 원소를 대신하여 조조 토벌 격문을 써서 조조의 조상 3대를 욕하기도 하였지만, 원소가 패하고 조조의 포로가 된 후 조조는 그의 옛 과오를 불문에 붙이고 그를 군모좨주(軍謀祭酒)에 임명하였다. 또 건안칠자의 한 사람인 왕찬(王粲)은 원래 유표(劉表)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형주(荊州)를 정벌했을 때 그는 유표의 아들 유종(劉琮)에게, "제가 알기로 조공(曹公: 즉 조조)은 걸출한 인물입니다. 웅대한 지략이 당대에 으뜸이고 뛰어난 지혜가 세상에서 출중합니다."라고 하면서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원소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도 나오지 않던 전주(田疇)도 조조가 오환을 정벌할 때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안내자를 맡았다. 조조는 관리를 임용할 때에 재능과 학식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위를 선택할 때에도 재능과 학식을 중시했다. 조조에게는 미모가 뛰어난 딸이 있었는데 많은 왕손들이 찾아와서 혼인을 청했다. 조조는 그들이 모두 대단한 집안의 자제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부 거절하였다. 그후 정의(丁儀)라는 유능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학식을 갖추었으나 외모가 추하고 한쪽 눈이 애꾸였다. 조조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조조의 아들 조비(曹丕)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말렸다. 정의는 비록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지만 외모가 너무 추하니 동생을 그런 사람에게 시집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조비에게 엄숙하게 답했다. "인재를 등용할 때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해야 하고, 사위를 선택할 때도 덕망과 재능을 겸비한 인물을 구해야 한다. 정의는 박학하고 다재다능한 이상 외모를 따질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 후 조조는 사람을 보내어 정의를 불러오게 하여 직접 그의 학문을 시험해 보았다. 과연 듣던대로 정의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한 조조는 즉시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 탁월한 전략가 조조는 병가(兵家)·법가(法家)·유가(儒家)·도가(道家) 등 제가의 사상에 정통하였다. 그는 많은 책들을 두루 열람하면서도 특히 병법을 좋아하여, 제가의 병법을 한데 모아 ≪접요(接要)≫라 하였으며, ≪손자(孫子)≫ 13편에 주석을 가하고, 수십만 자에 달하는 병서를 지었다. 그의 저술은 대부분 망실되었으나 ≪손자주(孫子注)≫와 ≪삼국지≫ 등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다. 조조는 전쟁이 정치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춘추시대 오(吳)나라의 부차(夫差)처럼 무력만 믿고 정치를 등한시해서도 안되고, 주(周)나라의 제후 서원왕(徐偃王)처럼 "인의(仁義)"로써 용병(用兵)을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군대는 정의로써 일으켜야 하고"(≪삼국지≫「무제기(武帝紀)」), "천하의 형세를 살펴서 합리적으로 반역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쟁 중에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는 황제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한(漢)왕실을 수호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하북 지역을 점령한 후에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문벌들의 겸병을 방지하는 조령을 반포하였다. 그는 경제가 전쟁의 승패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였다. 군대에 군수품과 양식이 없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진(秦)나라 효공(孝公)이 둔전(屯田)을 일으켜 서역을 평정한" 경험을 받아들여(≪삼국지≫「무제기」 裵松之 注), 둔전을 크게 일으켜 군사력의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조조는 "예(禮)로써는 군대를 다스릴 수 없다."(≪손자주(孫子注)≫)고 생각하고 유가의 예치(禮治)를 포기하였다. 그는 "군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조조집(曹操集≫「유령(遺令)」)고 강조하고 법으로써 군대를 다스릴 것을 중시하였다. 그는 신불해와 상앙의 법술을 종합하여 <군령(軍令)>·<보전령(步戰令)>·<선전령(船戰令)>·<논리사행능령(論吏士行能令)>·<패군저죄령(敗軍抵罪令)> 등과 같은 군사 훈련과 관리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군대의 지휘체계와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법규의 실행을 위하여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였다. 조조는 또 "적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먼저 계략을 써야 한다."(≪손자주≫)고 생각하였다. 계략은 그의 중요한 전략사상의 하나였으며, 그는 이 계략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열악한 조건으로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 뿐만 아니라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삼국지≫「제갈량전(諸葛亮傳)」) 그는 ≪손자≫를 신봉하였지만 장수들에게는 당시의 사회적 실상과 실전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한 그의 신서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다. 변화를 읽고 잘 대처하는 것이 용병의 핵심임을 강조한 그는 군대를 지휘할 때 "상황에 따라 기계를 세우고 적을 속여서 승리를 취하는 등 변화가 무쌍하였다."(≪삼국지≫「무제기」배송지 주) 건안(建安) 5년, 조조는 만여명의 병력으로 관도(官渡: 지금의 하남성 중모현中牟縣 경내)에서 원소의 십만대군과 대치하였다. 조조는 직접 기마병 5천을 이끌고 원소의 부하로 변장하여 야간에 몰래 오소(烏巢)를 습격, 원소군의 군량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그 결과 원소군은 대패함으로써 전쟁사상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물리친 범례를 남기게 되었다. 원소의 아들 원상(袁尙)과 원희(袁熙)는 북방으로 도망가서 오환족과 결탁하여 유주(幽州: 지금의 화북 북부와 요녕 남부 일대)를 점령하였다. 건안 12년 조조는 오환을 정벌하여 북방의 변경을 안정시킴으로써 남방 정벌 시의 후환을 미연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유표 진영에 있는 유비가 그 틈을 타서 허도(許都)를 습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다만 조조의 모사 곽가(郭嘉)만은 유표가 유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북벌을 지지하였다. 조조는 단호히 북벌을 감행하여 오환을 정벌했다. 조조는 도중에 연락을 끊고 불시에 기습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유성(柳城: 지금의 요녕성 금주시錦州市 서쪽, 오환 주둔지에서 200여리 떨어진 곳)에 있던 오환이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조조는 백랑산(白狼山: 지금의 요녕성 능원현凌源縣 경내)에서 적과 마주쳤다. 이때 조조의 대군은 여전히 후방에 있었다. 갑작스런 상황 변경으로 조조의 진영에서는 매우 당황해 하였으나 조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매우 침착하게 백랑산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자세히 살폈다. 적의 진용이 다소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장료(張遼)에게 선봉을 명하여 적을 기습하게 한 다음 일거에 오환을 격파하고 그들의 대장 답돈(蹋頓)의 목을 베었다. 원상과 원희는 오환의 다른 대장 속복환(速僕丸)과 함께 급히 요동으로 도망가서 그곳의 태수 공손강(公孫康)에게 몸을 의지하였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조에게 즉시 그들을 추격하여 후환을 없애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우리가 공손강에게 원상과 원희의 머리를 내놓도록 하면 될터이니 병사들을 귀찮게 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였다. 조조가 군대를 철수시키자 과연 공손강은 원씨 형제와 속복환의 목을 보내왔다. 조조의 장수들은 그에게 물었다. "공께서 군대를 철수시키자 공손강이 원상과 원희를 죽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공손강은 원래 원상 등을 두려워하였는데,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였더라면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하였을 것이나,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주자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건안 20년 2월 조조는 장노(張魯)를 공격하기 위해 한중(漢中)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장료·악진(樂進)·이전(李典) 등에게 7천여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합비(合肥)에 주둔하게 했다. 이때 조조는 그들에게 밀지를 내렸는데 겉봉에 "적이 쳐들어오면 열어보아라"라고 쓰여져 있었다. 8월에 손권이 10만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포위하였다. 이에 급히 그 밀지를 뜯어 보니, "만약 손권이 쳐들어오면 장장군과 이장군은 출전하고 악장군은 싸우지 말고 성을 지키시오."라고 쓰여져 있었다. 장료는 즉시 그 밀지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조공께서 원정을 떠나 계시니 구원병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우리를 격퇴시킬 것이오. 이는 우리에게 적군이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나가 싸워서 그들의 기를 꺾어야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 것이오.성패의 관건은 이 일전에 달려있소이다."
마침내 장료 등은 정예병 800명을 선발하여 용감하게 돌진하여 손권을 꺾었다. 손권은 매우 놀라서 10여일만에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장료는 다시 그들을 추격하여 손권을 격퇴하였다.
[출처] 조조에 대한 평가 ㉠ |작성자 안나 조조에 대한 평가 ㉡
2005/04/17 17:14 |
☞ 위대한 문학가
조조는 중국역사상 뛰어난 문학가이기도 하다. 그는 시와 음악을 좋아하고 서예에도 뛰어났다. 그는 "안으로는 문학을 수양하고 밖으로는 무공을 완성했다."(≪삼국지·위지≫「순욱전(荀彧傳)」) 당대(唐代)의 시인 장설(張說)은 <업도인(邺都人)>시에서 조조를 일러, "낮에는 장수들과 함께 견고한 적진을 무너뜨리고, 밤에는 문인들과 함께 화려한 저택에서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그는 도성에 서원(西園)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문인들을 접대했다. 그의 고향 초현에 있는 초망루(谯望樓)도 문인들과 모이는 장소였다.
그의 집정 시기에는 문학이 크게 흥성하여 건안문학(建安文學)이라는 독특한 시대를 열었는데, 조조와 그의 두 아들 조비(曹丕)·조식(曹植)을 비롯하여 그의 휘하에 있던 공융(孔融)·진림(陳琳)·왕찬(王粲)·서간(徐幹)·완우(阮瑀)·응창(應玚)·유정(劉楨) 등 이른 바 건안칠자(建安七子)를 중심으로 문단을 새롭게 수놓았다.
현존하는 조조의 시는 20여수이며 모두 악부시(樂府詩)이다. 그는 악부민가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옛 악부의 곡조로써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여 당시의 혼란한 정치상황과 백성들의 고통을 형상적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는 "동한말의 실록"이며 "시사(詩史)"라 일컬어진다.(종성鍾惺 <고시가(古詩歌)>)
예를 들면, <해로행(薤露行)>과 <호리행(蒿里行)>에서는 만가(挽歌)의 형식을 빌어 전란과 민생의 질고를 반영하였고, <고한행(苦寒行)>과 <거동서문행(去東西門行)>에서는 동한말의 군대생활의 고통을 반영하였으며, <단가행(短歌行)>과 <귀수수(龜雖壽)>에서는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대주(對酒)>와 <도관산(度關山)>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였고, <관창해(觀滄海)>에서는 넓고 장엄한 창해의 풍경 묘사 속에 자신의 흉금을 기탁하였다.
그의 시는 내용이 풍부하고 풍격은 처량하고 비장하며, 당시의 시대정신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있다. 그의 시는 건안문학의 독특한 시풍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희재(劉熙載)는 ≪예개(藝槪)≫에서 조조의 시를 일러, "기세가 웅장하고 힘이 넘쳐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으니, 건안시인들 중에서 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조의 산문은 <양현자명본지령(讓縣自明本志令)>이 대표작인데, 여기에서 그는 성숙한 정치가의 노련하고 용이주도한 계획을 표현하였다. 호방하면서도 자유로운 그의 문장은 위진남북조시기의 문풍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신은 조조를 일러 "문장 개혁의 선구자"라 평했다.
비록 조조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과오를 범하였지만, 그는 영웅적인 기개로 전쟁을 거듭하여 할거세력을 평정하고 난세를 바로잡았으며,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는 시대적 폐단을 개혁하고 사회적 기풍을 쇄신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역사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의 문치무공(文治武功)은 중국역사상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조조는 비록 잔혹하였지만 포학하지는 않았고, 냉혹하였지만 무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비록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코 처음부터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본래 생명과 감정을 소중히 여겼지만, 잔혹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사람을 죽이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만 결코 살인을 즐기지는 않았다.
조조는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왕조에서든 그와 같은 인물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조조는 바로 관료주의의 적이었으며 역대 관리들의 적이었던 것이다. 조조는 많은 문인들을 죽이고 성을 도살하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당연히 그를 좋게 평가할리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역사적 공헌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구동성으로 그를 간악한 인물이라 매도하였던 것이다.
조조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한나라를 찬탈한 간악한 도적"이라고 욕하였으며, 유비와 손권은 모두 당당하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한나라를 찬탈했다"고 비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조는 역사적으로 많은 공적을 남겼지만 그의 이름에 씌워진 간신의 멍에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었다. 소동파(蘇東坡)는 제갈량(諸葛亮)과 조조를 비교하면서, 제갈량은 병법과 영토·전쟁에 있어서 모두 조조에 못미쳤지만, 단 하나 지극한 충신이었다는 점에서 조조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인물을 평가할 때 재능과 공적보다는 인의(仁義)와 충효를 더 중시하였으며, 재능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재능은 다소 부족하여도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선호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조조보다는 유비나 제갈량을 높게 평가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출처] 조조에 대한 평가 ㉡ |작성자 안나
특히나 요세는 조조에 대한 제 해석이 많았죠...그 이문열의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주인공인 관계로 조조를 나쁘게 보았지만 제대로된 역사에서는 조조를...말그대로...천제로 봅니다...무제...굉장한 사람이죠...만화 '창천항로'에서도 멋지게나오는 조조...조조 좋아하시면 아니 삼국지좋아하시면 함 보세여...
문학가로서의 조조
조조는 당대 최고 수준의 문학가였다. 그는 특히 악부시라 불리는 시문학 장르에서 뛰어났고, 한 구절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오언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정사 삼국지에는 조조가 밖으로는 무공을 크게 이루고 안으로는 문학을 크게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조가 활동한 시기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의 연호를 딴 건안 시대(196-220)이다. 이에 따라 조조와 그 아들 조비, 조식 삼부자가 건안 문학을 크게 일으켰다고 평가한다.
건안 문학의 특징은 문장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며, 전란의 비참함을 노래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흥겨운 감정을 담기도 한다. 인간적인 고뇌와 정감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조조의 '단가행'의 일부를 보면 이렇다. '술을 마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인생살이 얼마나 되는가? 아침이슬과 같을 것이다. 지난날 많은 고통이 있었구나. 슬퍼하며 탄식해도, 근심 잊을 길이 없구나. 어떻게 근심을 풀 수 있을까? 오직 술뿐이네.'
둔전제를 처음 시행한 조조
조조는 문학, 사상, 조조는 중국 역사상 둔전제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인물로 이름이 높다. 후한 말기에는 오랜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해지고 농민들이 유랑하는 등 농업이 피폐해졌다. 조조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농기구, 씨앗, 식량 등을 국가가 빌려주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둔전관을 파견하여 농사를 지도, 감시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50% 이상을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의 특징은 이른바 병농일치에 있다. 황폐해진 농토를 군인들로 하여금 개발, 경작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면서 유사시에서는 전장에 나가 싸우게 했던 것이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 아래에서는 농민이 곧 군인이자 군인이 곧 농민이 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둔전제는 호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조조는 둔전제를 통해 군사비를 조달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만능 재주꾼 조조
정사 삼국지의 주석 부분에 따르면 조조는 '낮에는 군사전략을 궁리하고 밤에는 유교 경서를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고 한다. 또한 '높은 곳에 오르면 반드시 시를 읊조리고 새로운 시가 나오면 음악에 맞추어 노래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조조가 대단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조는 궁전 건물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만들 때 직접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모두 훌륭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조는 서예와 장기에도 능했다고 한다.
정사 삼국지의 위서 무제기편을 보면, 조조가 손자병법 관련 문헌을 널리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13편으로 엮은 것은 물론, 그것을 해설하는 주석을 달아 후세에 전했다고 한다. 조조가 정리, 해설한 손자병법을 위무주 손자병법, 즉 위나라의 무제인 조조의 손자병법이라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손자병법도 바로 위무주 손자병법이다. 조조가 문학, 사상, 음악, 건축, 기계 제작, 병법 연구에 두루 능통했던 만능 재주꾼임을 알 수 있다.
조조의 인품
조조의 인품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사 삼국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주석을 단 배송지는 <조만전>이라는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조만전>에 따르면 '조조는 인품이 경박하고 위엄이 없었으며, 대화할 때는 늘 농담하는 투였고, 기분이 좋으면 크게 웃었으며, 머리를 요리 접시에 처박아 두건에 음식이 묻어 지저분해지곤 했다'고 한다. 단, <조만전>은 오나라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조조를 일부러 깎아 내리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조의 이러한 경박함과 솔직함은 유교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인품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거짓으로 위엄 있는 척 꾸미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요컨대 조조의 인품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리를 추구한 조조와 법가 사상
도덕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덕이 아니라 무력으로 세상을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을 비롯한 유학자들은 조조를 나쁜 인물로 보았다. 더구나 헌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 아들 조비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평가는 도덕 원칙을 강조하는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유학자들은 그런 조조를 결코 곱게 볼 수 없다.
실제로 조조는 210년에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는 포고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능력만 뛰어나면 좋다'고 했다. 조조의 이러한 태도는 공허한 명분보다는 구체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유교가 아닌 법가 사상, 즉 정치에서 도덕을 제외시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에 따르면 조조는 '전국 시대의 법가 사상을 따랐다.'
조조의 출신 성분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조조는 한나라 건국 공신 조참의 후예이며, 환관이었던 할아버지 조등은 환관 최고의 관직을 지냈고, 그 양자인 조숭이 바로 조조의 아버지이다. 본래 하후씨 집안 사람이라는 설도 있는 조숭은 그 출신을 잘 알 수 없으나, 미천한 집안 사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또한 조조가 조참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아버지 조숭이 환관 조등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예라고 보기는 힘들다. 아버지 조숭은 태위 벼슬을 지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양아버지인 환관 조등이 거액의 뇌물로 벼슬자리를 사서 양아들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다른 성의 양자를 들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
집안 혈통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환관은 아무리 그 벼슬이 높다해도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 조조는 환관 조등이 맞아들인 다른 성의 양자 조숭의 아들이다. 4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인 원소와 무척 대조적이다. 그런 원소가 조조와의 싸움에 앞서 진림에게 쓰도록 한 격문을 보면, 역시 조조 집안과 조조의 출신 성분을 꼬집어 비난하고 있다.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인가?
조조는 동탁, 이각, 곽사 등의 위협 속에 허수아비 신세가 된 헌제를 구해냈다. 이를 두고 조조는 자신이 위태로운 한나라 황실을 구해낸 한나라의 충신이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조조는 동탁과 마찬가지로 헌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고 이름뿐인 한나라의 실권을 장악했다. 사실상 한나라의 지배자가 된 조조지만 끝까지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다. 220년 낙양에서 6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도, 조조는 어디까지나 한나라의 신하로써 일생을 마쳤다.
마음만 먹으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조조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조조가 자신을 한나라의 충성스런 신하라고 생각했을까? 조조의 마음이야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알기 힘들지만, 조조는 4백년 가까이 이어 온 한나라 황실의 정통성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조는 황제가 아니어도 사실상 황제나 마찬가지의 권력을 누렸다. 그런 조조로서는 한나라 황실을 수호하는 충신이라는 명분도 취하고 권력이라는 실리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삼국지 보물 ![]() 삼국지
삼국지 ![]()
2005/06/05 18:11
![]() http://blog.naver.com/peacekju/60013596879
http://blog.naver.com/peacekju/60013596879
|
|
자웅일대검 유비가 사용한 자웅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검으로 거병할 당시 대장간에서 제작한 검이다. |
|
|
청룡언월도 관우가 애용한 언월도. 거병할 당시 대장간에서 제작한 것으로 무게가 82근이나 된다. |
|
|
사모 장비가 애용한 강철창. 거병할 당시 대장간에서 제작한 것으로 길이가 1장 8척에 달한다. |
|
|
방천화극 여포가 애용한 창으로 창끝에 초승달 모양의 월아가 붙어 있다. |
|
|
의천검 청공검과 쌍벽을 이루는 조조의 검으로 하늘도 꿰뚫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검이다. |
|
|
청공검 의천검과 쌍벽을 이루는 검. 쇠를 두부 베듯이 베었다고 한다. 장판파에서 조운이 입수했다. |
|
|
고정도 손견이 애용한 검. 동탁과의 싸움에서 이 검으로 부대를 지휘했다 |
|
|
철등사모 정보가 애용한 창. 뱀처럼 창끝이 굽어 있으며 채모와 싸울 때 사용했다. |
|
|
수극 손책이나 태사자가 사용하던 무기. 창자루를 짧게 만들어 적에게 던져 공격을 하는 무기다. |
|
|
유성추 왕쌍이 애용하던 무기로 던져서 사용하는 무기. 밧줄 양끝에 쇠망치가 달려 있다. |
|
|
철편 황개가 사용한 철제 채찍. 채찍이라고 하기보다는 쇠막대기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
|
|
수전 용수철의 힘으로 짧은 화살을 쏘는 무기로 소매 속에 숨겨서 사용한다. |
|
|
칠성검 조조(曹操)가 동탁(董卓)을 죽이기 위해 사도 왕윤에게서 빌려온 왕씨 가문의 보도. "칠성보도"라고 함. |
|
|
쌍철극 전위(典韋)가 사용한 창으로 그 무게가 무려 80근이나 된다. |
|
|
단극 전위(典韋)의 무기로 짧은 창이다. 수리검처럼 던져서 사용한다. |
|
|
백염부 서황(徐愰)이 사용한 도끼이다. |
|
|
비도 남만왕 맹획(孟獲)의 처 축융부인(祝融夫人)이 사용했다. |
|
|
삼첨도 원술(袁術)의 수하장수 기령(紀靈)이 사용하던 언월도의 일종이다. 무게는 50근이나 되며, 창끝이 세갈래로 갈라져 있다. |
|
|
적토마 전신이 타는 불꽃같이 붉으며 8척의 명마.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알려져 있다. 적토마(赤兎馬)는 원래 동탁의 소유였으나 여포를 회유하기 우해 미끼로 주어졌다. 이에 여포는 감격하여 자신의 의부인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양자로 들어갔다. 후에 조조와 여포의 전투에서 여포가 생포되어 죽자 조조가 적토마를 소유하고 있다가 관우를 회유하기 위해 적토마를 주었다.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원소의 맹장 안량과 문추를 단 일합에 베었다고 한다. 이후 적토마는 늘 관우와 함께하였는데, 관우가 마충(馬忠)에게 생포되어 죽은 후 마충의 소유가 되었으나 적토마는 먹이를 거부하고 관우의 뒤를 따라 죽었다고 한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의하면 적토마는 온몸이 숯불처럼 붉고, 잡털이 하나도 없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장(丈)이고 키가 8척(尺)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
|
|
조황비전 조조의 애마. 허창에 헌제를 초대해 개최한 몰이 사냥 때 탔다. |
|
|
적로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유비가 적로를 유표에게 선물하자 괴월의 충고로 유표는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다시 유비에게 돌려주었다. 한편 채모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이적의 말로 유비는 서문으로 도망치게 된다. 채모가 말을 타고 그를 추격하던 중 유비는 단계라는 험한 물살과 폭이 넓은 강을 만나게 된다. 하는 수 없이 단계로 뛰어든 유비, 그러나 적로는 그 험한 물살을 해치고 나아갔다. 채모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미 유비는 적로의 활약으로 단계를 건너 도망칠 수 있었다. |
|
|
절영 조조의 애마. 절영이란 그림자가 안보일 정도로 빨리 달린다는 뜻으로 페르시아산 명마다. |
|
|
대완마위장(魏將) 왕쌍(王雙)이 타고 다녔던 말로 중앙아시아의 명마이다. 한혈마(汗血馬)(피땀을 흘릴 때까지 달리는 말), 천리정완마라고도 불린다. |
|
|
손자병법서 춘추시대의 오나라의 명장 손무가 쓴 병법서. 조조가 주석을 단 것이 현존한다. |
|
|
맹덕신서 조조가 썼다는 병법서. 장송의 조소를 받고 자기 손으로 태워버렸다고 한다. |
|
|
병법24편 제갈량이 죽기 전에 강유에게 맡긴 책. 군령, 진형 등에 관한 것이 적혀 있다고 한다. |
|
|
둔갑천서 도사인 좌자가 아미산의 석벽에서 입수한 요술서. 천, 지, 인의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태평청령도 도사 우길이 곡양천 근처에서 입수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신서. |
|
|
청낭서 화타가 자신의 의술을 기록한 의학서. 푸른 주머니에 들어 있다고 해 청낭서라고 불렀다. |
|
|
건상력주 감택이 저술한 논문으로 달력과 계절을 일치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오왕(吳王) 손권(孫權)은 이것을 오나라의 달력으로 사용했다. |
|
|
논어집해 위(魏)의 하안이 저술한 논문으로 "논어(論語)"의 주석서이다. |
|
|
구국론 초주가 저술한 논문으로 전쟁의 손익에 대한 내용이 있다. 촉(蜀)의 후주(後主)인 유선(劉禪)이 재임기간중 저술되었다. |
|
|
박혁론 손화가 저술한 논문으 위소에서 주사위 놀이가 유익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
|
|
변도론 조식(曹植)이 저술한 논문으로 도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
|
|
시요론 위(魏) 왕기가 저술한 논문으로 조상(曹爽)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의 풍조를 비판하였다. |
|
|
전론 위문제(魏文帝) 조비(曹丕)가 쓴 논문으로 동서고금의 인물, 정치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
|
|
춘추좌씨전 오경의 하나인 춘추를 공자의 제자인 좌구명이 해석한 경전이다. |
|
|
치론 왕창이 저술한 논문으로 위(魏)의 법률제도의 가혹성을 지적하고 법률제도의 개정을 요구한 서적이다. |
|
|
태평요술서 태평도(太平道)의 교주이자 황건난(黃巾亂)의 우두머리인 장각(張角)이 남화노선에게 받은 기서이다. 이 책에는 바람과 비를 일으키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한다. |
|
|
효경전 엄준이 쓴 논문.
|
'Study > Three Kingdoms Of Chi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Re:<삼국지에세이> 도원결의(桃園結義)를 생각하며....삼국지를 영화로 봅니다. (0) | 2010.04.29 |
|---|---|
| <단가행(短歌行)> (0) | 2010.03.25 |
| 기이한 이야기들 ‘삼국지의 불가사의’ (0) | 2010.02.20 |
| 고전의 보고(寶庫) ‘삼국지의 고사성어’ (0) | 2010.02.20 |
| <P>전국옥새는 진시황제 이래로 황제를 상징하는 물건, 황권을 상징하는 물 (0) | 2010.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