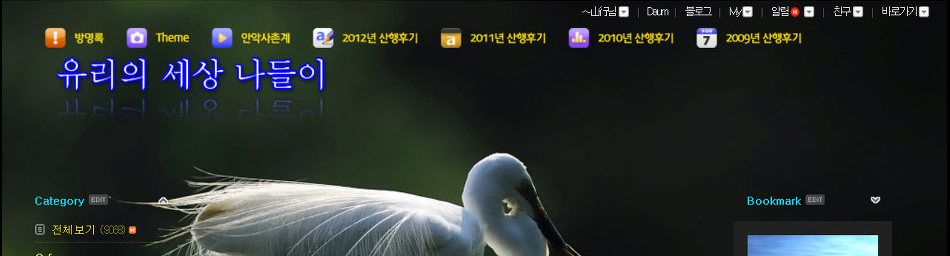시성(詩聖):두보와 시선(詩仙):이백
「詩聖(시성)」이라고 불리는 두보
이백과 함께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보는 이백과는 다른 경향을 지닌 시인이었다. 이백이 타고난 자유분방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인간의 기쁨을 드높이 노래했다면, 두보는 인간의 고뇌에 깊이 침잠하여 시대적 아픔을 깊은 울림으로 노래했다.
두보는 자가 자미(子美)이고 하남성 공현 사람으로 몰락한 관료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허다한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우수한 시가를 많이 썼다. 그는 30여 세 때 낙양에서 시인 이백을 만났다. 두보는 이백보다 11살 아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비록 성격은 달랐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아 극진한 벗으로 지냈다.
후에 두보는 장안에 가서 진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그 때는 간신 이림보가 정권을 전횡하고 있을 때라 공정하게 시험선발을 하지 않았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과거만이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이렇게 좌절을 당한 두보는 매우 낙심하였다.
벼슬길이 막힌 두보는 장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두보는 장안에서 가난에 시달리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집권자들의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과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두보는 자식을 굶겨 죽이기까지 하는 비참한 생활에 빠졌다.
그런 얼마 후 안사의 난이 일어나 장안과 낙양을 비롯한 중원 지역이 모두 안록산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민족 존망의 위급한 사태가 일어났다.
장안 일대의 백성들은 저마다 피난길에 올랐다. 두보도 가족을 데리고 피난민들 속에 끼어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마팀내 어느 시골집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두보는 당 숙종이 영무에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반란군에게 체포되어 장안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장안은 벌써 반란군들의 손 안에 들어가 있었다. 반란군들은 도처로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이듬해 간신히 장안에서 도망친 그는 숙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숙종을 만났다. 그 때 두보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변변한 옷도 한 벌 없었다.
몸에 걸친 것은 팔꿈치가 다 드러나가 해진 홑두루마기였으며 발에 신은 것은 낡은 삼신이었다.
당 숙종은 두보에게 좌습유란 관직을 주긴 하였지만 그를 중용하려 하지 않았다. 두보는 숙종에게 충언하다가 도리어 황제의 반감을 사 추방당하고 말았다.
두보는 각지를 방랑하는 가운데 전란과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었다. 두보 자신도 초근목피로 연명하였다.
이같은 분노와 비통함은 두보의 숱한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두보의 시가는 대부분이 안사의 난 때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쓴 것이다. 풍부한 문장력과 현실을 꿰뚫는 그의 시는 후세에 시의 성인이라는 즉 '시성(詩聖)'라는 이름으로 널리 추앙받았다. 두보의 시에 담겨 있는 기쁨과 슬픔은 바로 당시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었던 것이다.
詩仙(시선)」이라 불리는 이백
중국 성당기의 시인. 자 태백(太白). 호 청련거사(靑蓮居士).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한다.
그의 생애는 분명하지 못한 점이 많아, 생년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분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감숙성 서현에 살았으며, 아버지는 서역의 호상이었다고 전한다.
출생지는 오늘날의 사천성 촉나라의 장명현 또는 더 서쪽의 서역으로서, 어린 시절을 촉나라에서 보냈다.
남성적이고 용감한 것을 좋아한 그는 25세 때 촉나라를 떠나 양자강을 따라서 강남·산동·산서 등지를 편력하며 한평생을 보냈다. 젊어서 도교에 심취했던 그는 산중에서 지낸 적도 많았다. 그의 시의 환상성은 대부분 도교적 발상에 의한 것이며, 산중은 그의 시적 세계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였다.
안릉·남릉·동로의 땅에 체류한 적도 있으나, 가정에 정착한 적은 드물었다.
맹호연·원단구·두보 등 많은 시인과 교류하며, 그의 발자취는 중국 각지에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불우한 생애를 보내었으나 43세경 현종의 부름을 받아 장안에 들어가 환대를 받고, 한림공봉(翰林供奉)이 되었던 1, 2년이 그의 영광의 시기였다.
도사 오균의 천거로 궁정에 들어간 그는 자신의 정치적 포부의 실현을 기대하였으나, 한낱 궁정시인으로서 지위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청평조사(淸平調詞)》 3수는 궁정시인으로서의 그가 현종·양귀비의 모란 향연에서 지은 시이다. 이것으로 그의 시명은 장안을 떨쳤으나, 그의 분방한 성격은 결국 궁정 분위기와는 맞지 않았다.
이백은 그를 ‘적선인’이라 평한 하지장 등과 술에 빠져 ‘술 속의 팔선’으로 불렸고, 방약무인한 태도 때문에 현종의 총신 고력사의 미움을 받아 마침내 궁정을 쫓겨나 장안을 떠났다.
창안을 떠난 그는 하남으로 향하여 낙양·개봉 사이를 유력하고, 낙양에서는 두보와, 개봉에서는 고적과 지기지교를 맺었다.
두보와 석문에서 헤어진 그는 산서·하북의 각지를 방랑하고, 더 남하하여 광릉·금릉에서 노닐고, 다시 회계를 찾았으며, 55세 때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선성에 있었다.
적군에 쫓긴 현종이 촉나라로 도망하고 그의 황자 영왕 인이 거병, 동쪽으로 향하자 그의 막료로 발탁되었으나 새로 즉위한 황자 숙종과 대립하여 싸움에 패하였으므로 그도 심양의 옥중에 갇히었다.
뒤이어 야랑으로 유배되었으나 도중에서 곽자의에 의하여 구명, 사면되었다(59세). 그 후 그는 금릉·선성 사이를 방랑하였으나 노쇠한 탓으로 당도의 친척 이양빙에게 몸을 의지하다가 그 곳에서 병사하였다.
이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다. 청소년 시절에는 독서와 검술에 정진하고, 때로는 유협의 무리들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사천성 각지의 산천을 유력하기도 하였으며, 민산에 숨어 선술을 닦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방랑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고, 정신의 자유를 찾는 ‘대붕의 비상’이었다.
그의 본질은 세속을 높이 비상하는 대붕, 꿈과 정열에 사는 늠름한 로맨티시스트에 있었다.
또한 술에 취하여 강물 속의 달을 잡으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그에게도 현실 사회나 국가에 관한 강한 관심이 있고, 인생의 우수와 적막에 대한 절실한 응시가 있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방식과 응시의 양태는 두보와는 크게 달랐다.
두보가 언제나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인간 속에 침잠하는 방향을 취한 데 대하여, 이백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자유를 비상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는 인생의 고통이나 슬픔까지도 그것을 혼돈화하여, 그 곳으로부터 비상하려 하였다. 술이 그 혼돈화와 비상의 실천수단이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백의 시를 밑바닥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협기와 신선과 술이다. 젊은 시절에는 협기가 많았고, 만년에는 신선이 보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술은 생애를 통하여 그의 문학과 철학의 원천이었다.
‘성당(盛唐)의 기상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의 이백은 한편으로 인간·시대·자기에 대한 커다란 기개·자부에 불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개는 차츰 전제와 독재 아래의 부패·오탁의 현실에 젖어들어, 사는 기쁨에 정면으로 대하는 시인은 동시에 ‘만고의 우수’를 언제나 마음속에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그의 시문집은 송대에 편집된 것이며, 주석으로는 원대 소사빈의 《분류보주 이태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청대 왕기의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 등이 있다.
'Study > Chines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歸去來辭 귀거래사 (0) | 2010.11.29 |
|---|---|
|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西山大師 (0) | 2010.11.29 |
| 한시 감상 / 이백. 두보. 왕유 (0) | 2010.11.28 |
| 한시 모음 (from ASG) (0) | 2010.11.28 |
| [스크랩] 지리산 문학(고시편)| (0) | 201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