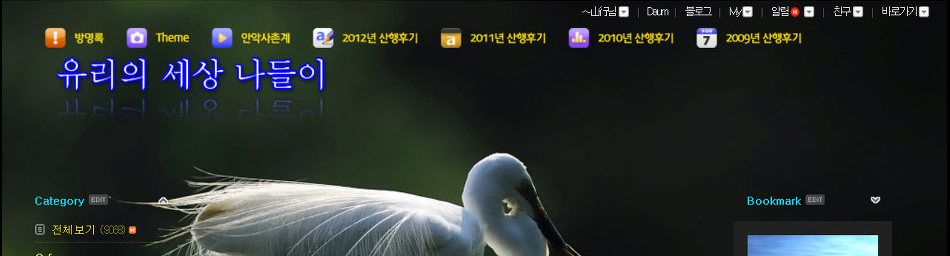좋은만남 6월호
의성 비봉산과 금성산
이상율/ SNT BIO 이사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은 옛날 동쪽의 의성현과 서쪽의 비안현(比安縣)이 합병되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의성군의 동쪽은 7천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였고, 비옥해진 토양에 한지형(寒地型) 육종 마늘과 고추, 사과, 자두 등 작물이 잘 자란다. 작물을 잘 기를 수 있는 ‘미생물 흙토피아’와 ‘네마 300T’를 공급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의성군의 동부에 있는 비봉산(飛鳳山)과 금성산(金城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성군에는 여러 산이 많으나 다녀 온 산으로는 비봉산, 금성산 그리고 빙계군립공원으로 유명한 춘산면(春山面)의 북두산(北豆山)이 있다. 북두산과 빙계공원(氷溪公園)은 다음 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2010년에 산행했던 금성면(金城面)의 금성산과 근래에 수시로 가 본 조문국(召文國) 유적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회원수가 11,000명 이상으로 크게 성장한 부산일요산악회와 함께하였다. 아침 7시 반에 덕천동에서 승차하여 10시 반 가까이 되어 비봉산 들머리에 도착했다. 준비운동을 하고 인원 파악 후 출발했다.
공지한 등로(登路)와 반대 방향인 비봉산 방향으로, 봄꽃이 한창인 산행 초입 들머리 들어서면, 곧이어 현위치 번호 비봉산 1표지판을 만난다. 늘 휴일이면 찾아다니는 산들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듯 신나고 즐거운 산길이다. 향긋한 봄 내음을 맡으며 줄 맞추어 앞으로 걸어간다.
이 길을 계속 걷다보면 비봉산 8번 표지판을 만난다. 이곳이 비봉산이다. 산불 감시 초소가 있는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살펴보면 남쪽으로 넓은 가음면(佳音面)의 들판이 조망되고, 동쪽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이자 요즈음 축제도 하는 산수유 마을이 보인다. 들머리에서 한 시간 정도 오르다 보면 남근바위 옆으로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아찔한 밧줄 암릉 구간도 있어서 산행의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한 비봉산에 도착하여 정상의 넓은 헬기장에서 점심을 먹는다.
비봉산(672m)과 금성산(531m)은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사곡면(舍谷面)에 걸쳐 있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보현산에서 뻗어 내린 지맥으로 형성된 금성산과 마주보는 비봉산은 의성의 주산이고 주위보다 높다. 시원한 조망으로 가슴이 확 트여 기분이 좋다.
보조 의자까지 준비하여 오신 산우(山友) 50여 명이 꽃향기 속에서 삼삼오오 점심을 먹은 후 말발굽 형상의 등로를 반 시계 방향으로 걸으며 금성산으로 향한다. 등로를 따라 오르면 신라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1) 때 의상(義湘) 조사가 창건한 수정사(水淨寺)로 빠져나가는 삼거리가 있다.
수정사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금성산 골짜기에 있다. 수정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신문왕 때 의상 대사가 수량암(修量庵)을 건립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조선 중기까지 전하는 사적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 대사(四溟大師)가 금성산에 진을 치고 왜적을 격퇴하였다고 한다. 고운사(孤雲寺)에도 대사의 흔적이 있는데, 밀양의 자랑 사명 대사는 직지사(直指寺)를 비롯 여러 곳에 그 행적이 남아 있어 반갑다.
지나는 길에 안내판이 있다. 영니산(盈尼山) 봉수(烽燧)는 조선시대 제2로 직봉 노선의 내지 봉수로 그 운영 시기와 축조 연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 조선 중기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 봉수대의 방호벽이 ㄱ 자 형태로 남아 있다.
해발 445m에 위치한 봉수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영니산 봉수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봉수대는 승원산에서 봉수 신호를 받아 대야산 봉수대로 전달했다고 한다.
1994년 의성문화원에서 답사하고 푯말을 세웠다는 표지판 안내 글을 읽어 본다. 금성산은 그 모양이 가마처럼 생겼다 해서 가마산이라고도 부른다. 금성산이 자리 잡은 금성면은 고대 조문국의 도읍지여서 석탑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조문국(召文國) 유적지와 박물관을 둘러볼 겸 앞으로 등산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국 군 지휘부의 초소 구실을 했다는 관망대를 지나며 하산한다. 조문국이 최후의 결전을 치를 때 부녀자까지 동원되어 돌을 날랐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한다.
금성산 산성터를 지나며 하산을 마치고, 가음초등학교 앞에서 준비해 간 두부를 먹으며 산행을 마무리한다. 제주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이 있었던 곳이라 고사리도 제법 꺾어서 그 수확이 쏠쏠하다. 오늘은 점심시간을 포함, 5시간 정도 걸었다.
며칠 전 지나다가 둘러본 「경덕왕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韓國鄕土文化電子大典)」을 보면 의성 지역의 고대 국가였던 조문국의 경덕왕(景德王) 능과 관련된 전설을 알 수 있다.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아래에 탑리역(塔里驛)이라는 조그마한 역이 있는데, 이 탑리역을 중심으로 하여 금성면 일대가 조문국의 도읍지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구릉 같은 고분(古墳)이 산재하고, 조각된 주춧돌을 비롯하여 옛날 토기와 철구(鐵具)가 많이 발견되었다. 대리리(大里里)에 경덕왕릉이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에 왕릉의 발견과 관련된 신기한 전설이 실려 있다. 조문국에 관한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전해 온다.
전통적인 양식을 갖춘 경덕왕릉은 봉분 아래에 화강석 비석과 상석이 있다. 1725년(영조 원년) 현령 이우신(李雨臣)이 경덕왕릉을 증축하고 하마비 등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왕릉 제사를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 그 후 경덕왕릉보존회가 제사를 잇고 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묘역은 ‘조문국경덕왕릉’이라 쓰인 비석과 문인석·장명등·상석으로 단장되어 있다.
경덕왕릉이 발견된 배경과 관련한 신기한 전설이 조선 숙종 때 인물인 허미수허미수(許眉叟) 선생의 문집에 실려 있다.
현재의 능지는 약 500년 전에 오극겸(吳克謙)의 외밭이었다. 외를 지키던 오극겸의 꿈에 금관을 쓰고 조복(朝服)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신라시대 조문국의 경덕왕인데 너의 원두막이 나의 능위이니 속히 철거하라.”라고 이르고는, 외직이의 등에다 글 한 줄을 남기고 사라졌다. 외밭 주인이 일어나 보니 꿈속에 노인이 써 준 글이 자신의 등에 그대로 씌어 있었다. 그래서 현령께 고하고 유지들과 의논하여 봉분을 만들고 매년 춘계 향사를 올렸다. 지금도 제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의성은 경북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근래 영덕 당진 간 30번 고속국도가 개통됨으로써 교통이로 사통팔달이다. 중부 내륙 55번 고속국도의 의성 IC와 30번 고속국도의 서의성, 북의성 IC가 있다. 또 5번 국도도 있다. 요즘 짬짬이 촌집과 텃밭도 둘러보고 부동산도 자주 찾아간다. 경북 지역에서 흙토피아를 공급하기에 좋은 곳이다.
앞으로 이곳 의성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대표적인 곳이 아닐까 한다.
유적지 입구에 가면 입석에 새겨진 시가 있다. 만사(晩沙) 김진종(金振鍾, 1883~1951) 공(公)이 지은 ‘次召文景德王陵竪碑韻(차조문경덕왕릉수비운)’이다. 공은 의성(義城) 사촌(沙村) 출신으로 자는 성언(聲彦)이고 관향은 안동(安東)이다. 경사자집(經史子集)과 백가서(百家書)를 섭렵하고, 시(詩)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召文往跡杳千秋(조문왕적묘천추) 조문국의 지난 자취 천추에 아득하니
曠感興懷涕欲流(광감흥회체욕류) 오랜 광세의 감회엔 눈물이 흐르려 하는구나.
世遠嗟無徵國史(세원차무징국사) 아! 오랜 세월에 증험할 역사도 없건만
禋精應有格靈休(인정응유격령휴) 정성스런 제사에 아름다운 혼령들 응당 이르리.
杉松增彩新趺座(삼송증채신부좌) 삼송들 새로 세운 비석에 푸른빛 더하는데
葵麥堪憐舊殿樓(규맥감련구전루) 들풀은 옛 궁궐터의 가련함을 견디고 있네.
敬肅餘芬猶未泯(경숙여분유미민) 아직도 남은 향기에 공경히 숙배하니
行人咸式古城頭(행인함식고성두) 길손마다 옛 성터에 존경심을 표하네.
의성군은 옛날 동쪽의 의성현과 서쪽의 비안현이 합병되어 이루어진 군이라고 한다.
의성군의 동쪽은 7천만전에 화산폭발로 인해 비옥 해진 토양이 빚어낸 한지형 육종마늘과 고추 사과 자두등 작물이 잘 자라고
그 작물을 대상으로 미생물 흙토피아와 네마300T 영업으로 자주 방문하고 있는 의성 동부에 있는 금성산 비봉산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의성군의 산으로는 여러산이 많으나 다녀 온 산으로는 이번의 비봉산 금성산, 그리고 빙계군립공원으로 유명한 춘산면의 북두산이 있다.
북두산과 빙계공원은 다음회에 소개 하기로 하고 2010년 산행을 하였던 금성면의 금성산과 근래에 수시로 가 보는 조문국유적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회원수가 11,000명 이상인 큰 단체로 성장한 부산일요 산악회와 함께 하였다.
아침 7시 반에 덕천동에서 승차하여 10시 반 가까이 들머리에 들어서서 준비운동을 하고 인원파악후 출발 한다.
공지한 등로와 반대방향으로 우선 비봉산 방향으로 봄꽃이 한창인 산행초입 들머리 들어서면 곧 현위치 번호 비봉산 1표지판을 만나고 향긋한 봄 내음속으로 줄맞추어 앞으로 걸어간다.
늘 휴일이면 찿아 다니는 산들이 항상 반갑게 맞이 하는듯 신나고 즐거운 산길이다.
이길을 계속 걷다보면 비봉산8번 표지판은 만나는데 이곳이 비봉산이다.
산불초소가 있는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살펴보면 남쪽으로는 넓은 가음면의 들판이 조망되고
동쪽으로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이자 요즈음 축제도 하는 산수유 마을도 보인다.
들머리에서 한시간 정도 오르다 보면 남근바위 옆으로는 네발로 기어 오르는 아찔한 밧줄 암릉 구간도 있어서 산행을 하는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봉황이 날아 오르는듯 8번 표지판이 있는 비봉산(671m)에 도착하여 정상의 넓은 헬기장에서 점심을 멱는다.
비봉산(672m)과 금성산(550m)은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사곡면에 걸쳐 있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보현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으로 형성된 금성산과 마주보고 있는 비봉산(해발 671m)과 같이 의성의 주산이고 주위보다 많이 높아서 시원한 조망으로 가슴이 확트여 기분이 좋다.
보조의자 까지 준비하여 오신 50 여명의 산우들이 삼삼오오 점심을 꽃향기 속에서 먹은후 발발굽 형상의 등로 반 시계 방향의 등로를 따라 금성산으로 향한다.
등로를 따라 오르면 신라 신문왕 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수정사로 탈출하는 3거리가 있다.
금성산 계곡에 위치하는 수정사는 깊은 골짜기 사이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지어져있다.
수정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신라 신문왕 때(681~691) 의상대사가 ‘수량암(修量庵)’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였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조선 중기까지 전하는 사적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 유정스님이 머물면서 금성산(金城山)에 진을 치고 왜적을 격퇴하였다는데 고운사에서도 대사님의 흔적이 있었는데 밀양의 자랑 사명대사는 직지사를 비롯 어디든지 행적이 남아 있어서 반갑다.
지나는 길 안내판에 영니산 봉수는 조선시대 제2로 직봉노선의 내지봉수로 운영시기와 축조연대를 확인 할 수 없지만 문헌자료를 통해 조선중기 까지 존치 하였음을 알 수 있다.2009년에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봉수의 방호벽은 ㄱ자 형태로 남아있다는 글을 볼때 봉수대로서 중요한 역활을 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해발 445m에 위치한 봉수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영니산봉수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영니산봉수대는 승원산에서 받아 대야산봉수대로 전달 되었다고 한다.
1994년 의성문화원에서 답사를 하고 푯말을 세웠다는 표지판안내글을 읽어 보며 걷는다.
해발 531m의 금성산은 산의 모양이 가마처럼 생겼다 해서 가마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금성산이 자리잡은 금성면은 고대 조문국의 도읍지여서 석탑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조문국 유적지와 받물관을 둘러볼 겸 앞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찿아 오지 않을까 생각 된다.
조문국의 군 지휘부의 초소 역활을 하였다는 관망대를 지나며 하산을 한다.
조문국이 최후의 결전을 치룰때 부녀자까지 동원되어 돌울 날랐다고 하는데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
금성산 산성터를 지나며 완전 하산을 하고 가음초등학교 앞에서 준비 해 간 두부로 하산식을 먹으며 산행은 마무리 한다.제주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화산활동이 있었던 곳이라 고사리도 제법 꺾어서 수확이 솔솔하고 하루 점심시간 포함 5시간정도 걸었다.
며칠전 지나다 둘러 본 「경덕왕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을 보면 의성 지역의 고대 국가였던 조문국[召文國] 경덕왕(景德王)의 능과 관련된 전설을 살펴 볼 수 있다.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아래에는 탑리역(塔里驛)이라는 조그마한 역이 있는데 탑리역을 중심으로 금성면 일대는 조문국의 도읍지였다고 한다.
구릉 같은 고분(古墳)이 산재하고, 조각된 주춧돌을 비롯하여 옛날 토기와 철구(鐵具)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대리리에는 경덕왕릉이 있는데,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집(文集)에 왕릉의 발견과 관련된 신기한 전설이 실려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
옛 조문국 경덕왕릉은 그 형식이 전통적인 고분으로서 봉 아래 화강석 비석과 상석이 있다. 1725년(영조 원년) 현령 이우신이 경덕왕릉을 증축하고 하마비 등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왕릉제사를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고, 그후 경덕왕릉보존회가 구성되어 다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묘역은 ‘조문국경덕왕릉’이라고 쓰여진 비석과 문인석·장명등·상석으로 단장되어 있다.
경덕왕릉이 발견된 배경에 대한 신기한 전설이 조선 숙종 때 <허미수 문집>에 실려있다.
현재의 능지는 약 500년 전에 오극겸의 외밭이었다.
외를 지키던 어느 날 밤 꿈에 금관을 쓰고 조복을 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신라시대 조문국의 경덕왕인데 너의 원두막이 나의 능위이니 속히 철거를 하라.”고 이르고는 외직이의 등에다 한줄의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에 놀란 외밭 주인은 일어나 보니 꿈속에 노인이 써준 글이 그대로 자기 등에 씌어 있어 현령께 고하고 지방의 유지들과 의논하여 봉분을 만들고 매년 춘계향사를 올렸으며 지금도 제례행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의성은 경상북도의 중심이고 근래 영덕 당진간 30번 고속국도가 완전 개통 됨으로서 교통의 중심으로 사통팔달이다.
중부 내륙 55번의 의성 IC, 그리고 30번의 서의성,북의성 IC가 있고 5번 국도가 있어서 경북지역 전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지라 생각이 되어
요즘 짬짬이 촌집과 텃밭도 둘러보고 검색도 자주하면서 부동산도 자주 찿아 가는 곳이다.
앞으로 이곳 의성은 자리를 잡아 제2의 인생을 살고싶은 곳 1순위가 아닐까 한다.
유적지 입구의 입석에 새겨진 "次召文景德王陵竪碑韻(차조문경덕왕릉수비운)"
召文往跡杳千秋(조문왕적묘천추) 조문국의 지난 자취 천추에 아득하고
曠感興懷涕欲流(광감흥회체욕류) 공허한 감흥에 일어나는 회한에 눈물 흘리네
世遠嗟無徵國史(세원차무징국사) 차홉다 세대가 멀어 역사를 찾을 수 없으나
禋精應有格靈休(인정응유격령휴) 정성드려 제사모시니 혼령은 알지로다
杉松增彩新趺座(삼송증채신부좌) 삼나무와 소나무 빛이 새로운데
葵麥堪憐舊殿樓(규맥감련구전루) 가련하다 옛날의 궁전들 빈터만 남았으나
敬肅餘芬猶未泯(경숙여분유미민) 경건하게 향불 올림은 아직도 여전하니
行人咸式古城頭(행인함식고성두) 길손들은 너 나 없이 옛 성터라 말하네
만사(晩沙) 김진종(金振鍾,1883~1951)